 강신주의 노자 혹은 장자 : 노자의 길과 장자의 길 사이에서
강신주의 노자 혹은 장자 : 노자의 길과 장자의 길 사이에서

- 저자 :강신주
- 출판사 :오월의봄
- 출판년 :2014-09-17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1-06)
- 대출 0/1 예약 0 누적대출 38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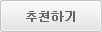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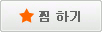
강신주 철학의 출발점!
노자의 길을 갈 것인가, 장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책은 새롭게 집필된 게 아닙니다. 10년 전의 초기 저작 두 권, 그러니까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과 《노자: 국가의 발견과 제국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거니까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그만큼 이 두 권의 책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강물이 하나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썼던 서른 권 정도의 책은 바로 이 두 권의 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의아스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기원이라면 보통 하나인데, 지금 저는 제 사유의 기원으로 장자와 노자 두 사람을 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에서 생택쥐페리(Saint Exupery)는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생택쥐베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어려울 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향을 보게 될 때, 사랑은 이미 변질된 것 아닐까요. 동일한 신을 믿는 교우 관계, 아이만을 보는 것으로 지속되는 부부 관계, 혹은 대의를 지키려는 동지의 관계로 말이지요. 이 부분이 장자와 노자의 사유를 이해할 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생택쥐페리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장자이고, 그 입장을 긍정하는 것이 바로 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자가 사랑이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고 역설한다면, 이와 달리 노자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이유로 장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자 이해가, 반대로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장자 이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제게 장자는 반복하고 싶은 선생님이었다면, 노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반면교사였던 겁니다. 마주보아야 할 타자를 강조했던 장자, 그리고 공통 원리로서 국가를 강조했던 노자! 이 두 사상가는 제 내면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만큼 저의 사유는 역동적으로 변했고 다채로워졌습니다. 당연히 저의 사유도 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노자와 장자를 다룬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제 사유의 기원을 명료히 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노자와 장자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머리말에서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는 책 제목 그대로 나는 장자의 속내는 타자와의 소통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와 이질적인 타자와 소통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건 정말로 똥줄이 빠지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숨을 내건 결단’, 혹은 스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백척간두진일보’의 기개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주체 형식을 바꾸어야, 쉽게 말해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타자와의 소통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장자가 우리에게 권고했던 치열한 자기 수양은 타자와 소통하려는 열망에 종속된다는 것, 내 첫 책이 밝히려고 했던 건 바로 이것이다. 운 좋게도 타자와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흔적도 남을 수밖에 없을 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머릿속에 있던 ‘도(道)’였다. 바로 여기에서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그러니까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는 장자의 사자후가 포효하게 된다.
2003년 책이 등장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당혹감 자체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2000여 년 동안 장자는 도(道)를 찾아 헤맸던 철학자로 이해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혹감은 너무 자연스런 반응인지도 모른다. 내 책은 장자에게 있어 도는 미리 존재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꾸역꾸역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흔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료와 선배 학자들의 당혹감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모를 일이다. 사실 그때까지 장자는 노자(老子)라는 철학자의 사유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사상가, 그러니까 장자는 노자의 난해한 사유를 에피소드와 우화라는 기법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했던 충실한 후학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었다. 분명 노자에게 도(道)는 우리와 무관하게 미리 존재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를 낳은 신과 같은 것으로 사유되고 있다. 그렇게 내 책은 학계에 나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장자에게서나 노자에게서 ‘도’라는 개념이 그렇게도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명한 것으로 수용되었던 도가(道家)라는 범주는 해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일까, 당시 몇몇 동료 학자들은 내게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 강선생! 노자와 장자가 그렇게 다르다면, 노자와 관련된 글을 한 번 써보는 것이 어때요.” 근사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노자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노자와 장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걸.” 속으로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는 노자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30대 후반의 패기만만한 학자였던 나는 정말 폭풍우처럼 집필에 들어갔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쓴 단행본 중에서 이보다 강도 높고 빠르게 집필된 책도 없을 것이다. 2004년 4월 《노자: 국가의 발견과 제국의 형이상학》이란 내 두 번째 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노동력이든 재화든 수탈하고, 그걸 (재)분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탈과 재분배의 메커니즘이 바로 국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의 위대함, 아니 무서움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여 그걸 싸늘한 눈으로 통치자의 정치에 응용하려는 데 있다. 바로 이 수탈과 재분배의 메커니즘을 노자는 ‘도’라고 불렀던 것이다. 계속 수탈하고 분배를 게을리 한다면,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마침내 국가는 와해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애써 수탈한 걸 다시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건 역설처럼 보인다. 이렇게 재분배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수탈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재분배의 길, 즉 도를 따른다는 건 정말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통치자의 치열한 자기 수양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재분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 피통치자는 통치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두 번째 책으로 내 생각에 대한 학계의 오해는 풀렸을까. 아니다. 불행히 오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학계가 내 생각에 이제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점이다. 쟁점을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무의식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 모를 일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2003년 첫 책을 집필할 때부터 2004년 두 번째 책을 집필할 때까지, 이 짧다면 짧은 기간만큼 강렬하게 정신이 불타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노자를 다룬 두 번째 책은 거의 3주 만에 초고가 완성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나는 내 몸과 정신을 활활 태운 셈이다. 정말 귀신에 씌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하기라도 했겠는가. 그러니 학계의 두터운 통념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이 읽어버렸던 노자와 장자를 당당히 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세상물정을 몰랐던 30대 후반의 치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0년 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은 그 후 내 사유와 집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객관적인 연구자로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철학자로서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 나는 장자가 피력했던 인문정신과 노자가 품고 있었던 반인문정신 사이에서 결단해야만 했다. 인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당당히 걸어간다면, 나는 장자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보다는 체계나 구조의 힘에 몸을 맡긴다면, 나는 노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나는 장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인간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면, 인문학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28권이나 출간된 내 책이 모두 인문학 찬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10년 전의 어떤 결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몰랐지만 10년 전 출간된 두 권의 책은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움직이는 내 사유를 만들었던 자궁, 혹은 내 사유의 맹아였던 셈이다.
-프롤로그에서
노자의 길을 갈 것인가, 장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책은 새롭게 집필된 게 아닙니다. 10년 전의 초기 저작 두 권, 그러니까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과 《노자: 국가의 발견과 제국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거니까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그만큼 이 두 권의 책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강물이 하나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썼던 서른 권 정도의 책은 바로 이 두 권의 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의아스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기원이라면 보통 하나인데, 지금 저는 제 사유의 기원으로 장자와 노자 두 사람을 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에서 생택쥐페리(Saint Exupery)는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생택쥐베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어려울 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향을 보게 될 때, 사랑은 이미 변질된 것 아닐까요. 동일한 신을 믿는 교우 관계, 아이만을 보는 것으로 지속되는 부부 관계, 혹은 대의를 지키려는 동지의 관계로 말이지요. 이 부분이 장자와 노자의 사유를 이해할 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생택쥐페리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장자이고, 그 입장을 긍정하는 것이 바로 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자가 사랑이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고 역설한다면, 이와 달리 노자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이유로 장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자 이해가, 반대로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장자 이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제게 장자는 반복하고 싶은 선생님이었다면, 노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반면교사였던 겁니다. 마주보아야 할 타자를 강조했던 장자, 그리고 공통 원리로서 국가를 강조했던 노자! 이 두 사상가는 제 내면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만큼 저의 사유는 역동적으로 변했고 다채로워졌습니다. 당연히 저의 사유도 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노자와 장자를 다룬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제 사유의 기원을 명료히 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노자와 장자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머리말에서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는 책 제목 그대로 나는 장자의 속내는 타자와의 소통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와 이질적인 타자와 소통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건 정말로 똥줄이 빠지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숨을 내건 결단’, 혹은 스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백척간두진일보’의 기개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주체 형식을 바꾸어야, 쉽게 말해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타자와의 소통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장자가 우리에게 권고했던 치열한 자기 수양은 타자와 소통하려는 열망에 종속된다는 것, 내 첫 책이 밝히려고 했던 건 바로 이것이다. 운 좋게도 타자와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흔적도 남을 수밖에 없을 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머릿속에 있던 ‘도(道)’였다. 바로 여기에서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그러니까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는 장자의 사자후가 포효하게 된다.
2003년 책이 등장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당혹감 자체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2000여 년 동안 장자는 도(道)를 찾아 헤맸던 철학자로 이해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혹감은 너무 자연스런 반응인지도 모른다. 내 책은 장자에게 있어 도는 미리 존재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꾸역꾸역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흔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료와 선배 학자들의 당혹감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모를 일이다. 사실 그때까지 장자는 노자(老子)라는 철학자의 사유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사상가, 그러니까 장자는 노자의 난해한 사유를 에피소드와 우화라는 기법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했던 충실한 후학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었다. 분명 노자에게 도(道)는 우리와 무관하게 미리 존재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를 낳은 신과 같은 것으로 사유되고 있다. 그렇게 내 책은 학계에 나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장자에게서나 노자에게서 ‘도’라는 개념이 그렇게도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명한 것으로 수용되었던 도가(道家)라는 범주는 해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일까, 당시 몇몇 동료 학자들은 내게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 강선생! 노자와 장자가 그렇게 다르다면, 노자와 관련된 글을 한 번 써보는 것이 어때요.” 근사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노자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노자와 장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걸.” 속으로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는 노자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30대 후반의 패기만만한 학자였던 나는 정말 폭풍우처럼 집필에 들어갔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쓴 단행본 중에서 이보다 강도 높고 빠르게 집필된 책도 없을 것이다. 2004년 4월 《노자: 국가의 발견과 제국의 형이상학》이란 내 두 번째 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노동력이든 재화든 수탈하고, 그걸 (재)분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탈과 재분배의 메커니즘이 바로 국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의 위대함, 아니 무서움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여 그걸 싸늘한 눈으로 통치자의 정치에 응용하려는 데 있다. 바로 이 수탈과 재분배의 메커니즘을 노자는 ‘도’라고 불렀던 것이다. 계속 수탈하고 분배를 게을리 한다면,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마침내 국가는 와해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애써 수탈한 걸 다시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건 역설처럼 보인다. 이렇게 재분배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수탈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재분배의 길, 즉 도를 따른다는 건 정말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통치자의 치열한 자기 수양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재분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 피통치자는 통치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두 번째 책으로 내 생각에 대한 학계의 오해는 풀렸을까. 아니다. 불행히 오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학계가 내 생각에 이제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점이다. 쟁점을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무의식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 모를 일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2003년 첫 책을 집필할 때부터 2004년 두 번째 책을 집필할 때까지, 이 짧다면 짧은 기간만큼 강렬하게 정신이 불타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노자를 다룬 두 번째 책은 거의 3주 만에 초고가 완성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나는 내 몸과 정신을 활활 태운 셈이다. 정말 귀신에 씌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하기라도 했겠는가. 그러니 학계의 두터운 통념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이 읽어버렸던 노자와 장자를 당당히 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세상물정을 몰랐던 30대 후반의 치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0년 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은 그 후 내 사유와 집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객관적인 연구자로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철학자로서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 나는 장자가 피력했던 인문정신과 노자가 품고 있었던 반인문정신 사이에서 결단해야만 했다. 인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당당히 걸어간다면, 나는 장자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보다는 체계나 구조의 힘에 몸을 맡긴다면, 나는 노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나는 장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인간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면, 인문학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28권이나 출간된 내 책이 모두 인문학 찬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10년 전의 어떤 결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몰랐지만 10년 전 출간된 두 권의 책은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움직이는 내 사유를 만들었던 자궁, 혹은 내 사유의 맹아였던 셈이다.
-프롤로그에서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